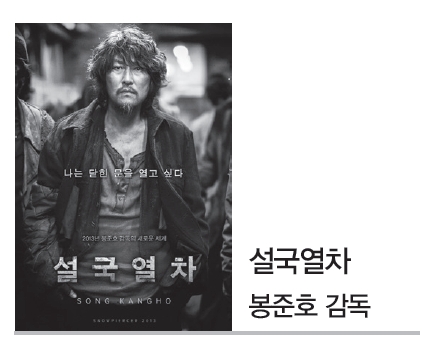
쉼 없이 달리는 열차가 있다. 그들에게 열차는 공간을 넘어선 세계이자 존재 그 자체다. 125분의 러닝타임 속, 영화는 인류의 역사와 순환, 계급투쟁, 나아가 생태계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이 복잡한 내러티브를 납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열차의 칸’에 있다.
꼬리 칸을 시작으로 엔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인류와 꼭 닮았다. 주목할 점은 열차를 유지시키는 모든 것이 ‘균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열차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인물들마저 소모품처럼 이용한다. 즉, 영화 전반을 끌어가는 혁명 역시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해피뉴이어’ 이벤트에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후반부에 가서 이 빈틈없는 세계는 크로놀 한 줌에 인해 막을 내리게 된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허무하고 절망적인 엔딩이다. 새로운 인류를 이끌어 가기에 생존한 두 아이들은 나약하고 어려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절망보다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령 커티스가 혁명에 성공했을지라도 젊고 새로운 지도자를 향한 또 다른 혁명은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다. 그러나 커티스는 체제의 반복 대신 열차 바깥세상을 선택하게 된다. 유일하게 열차 바깥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보안 설계자 남궁민수는 커티스의 선택에 길잡이가 되어 준다. 그 결과 새로운 생태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인류는 악습으로부터의 진정한 탈출을 성공하게 된다.
이렇듯 설국열차는 열차의 안과 밖 중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결말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개연성과 편집의 문제를 떠나 영화를 보는 관점이 나눠지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만큼이나 극단적인 평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영화가 단순히 킬링 타임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열차의 문 앞에서의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