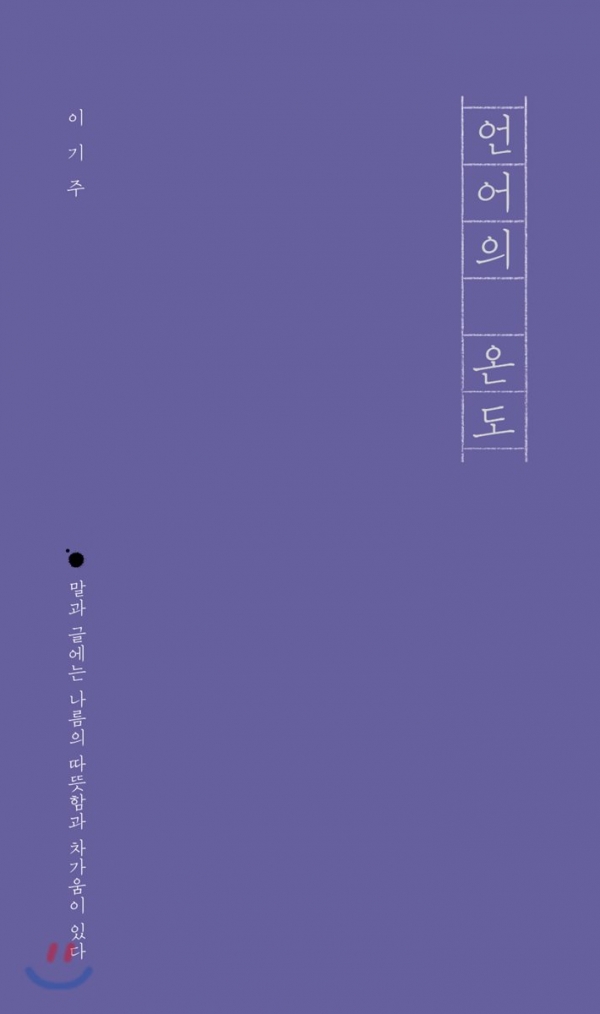
<언어의 온도>는 직접 돈을 주고 산 첫 에세이 도서이다. 가볍게 읽기 좋은 에세이의 특성 때문인지 구매하기보다는 서점에서 대충 훑어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언어의 온도>를 처음 발견한 것은 베스트셀러 코너에서였다. 어느 서점에서는 아예 특정 코너가 <언어의 온도>로 도배된 경우도 보았다. ‘단지 광고를 많이 하는 유명한 책’, 이 책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추천해줘서 늦게야 한 번 읽어보게 되었다. 좋은 글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며 읽는 습관이 있다. 책을 읽은 뒤 ‘광고를 많이 하는 유명한 책’에서 ‘표시할 것이 많은 책’으로 단번에 느낌이 바뀌었다. 짧은 문장 한 줄에 인생이 담겨 있었다. 몇 장을 넘기지 못하고 바로 책을 구매했다. 어린아이가 간식을 아껴 먹는 것처럼 아끼고 아껴 한 글자, 한 문장씩 천천히 음미하였다.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흔한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보편적으로 좋은 책으로 느껴지는 책이다. 작가는 분명히 깊은 생각,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좋은 말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평소 실언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의지를 다듬게 해주는 한 줄이었다. 실언에 대한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질 않았는데 머리에 새겨놓고 오래오래 곱씹을 것 같다.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 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5개 정도 꼽으라면 이 문장을 선택할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공감하며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심지어 공감은 피곤한 일이라 생각했다. 이제는 ‘진짜 공감’보다 머리로 하는 인위적인 공감, 즉 ‘가짜 공감’이 편해진 게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느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만 했었구나. ‘공감’의 의미를 ‘위로’로 잘못 알고 살아왔었구나. ‘진심’에서 뻗어가는 언어들은 형식적인 사회의 기준에 맞춰 그 온기를 잃어가고 있다. 저자는 사람들이 남은 ‘진심’을 지켜내도록 그들의 언어의 온기를 불어넣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